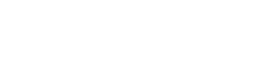칼럼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개혁운동 ④] ‘훈맹정음’과 박두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11-03 11:59 / 조회 2,533 / 댓글 0본문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개혁운동 ④] ‘훈맹정음’과 박두성
김일환 목사
2015년에는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평신도운동’이라는 주제로 다섯 편이 연재되었고, 올해부터는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개혁운동’이라는 주제로 다섯 편의 글이 연재되는데요. 일제의 강제점령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교회개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인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혁하려는 시도, 교회 안에서 남녀차별 문제의 철폐와 평신도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장애인도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리는 운동, 일제의 황국신민화에 굴복하여 협력한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그 후의 행동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글들이 현재의 한국교회사를 삶으로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개혁을 위하여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
1. 예수교 자유교회를 아십니까?
2. 조선 교인은 선교사의 하인(下人)이 아닙니다.
3. 교회에서 남존여비(男尊女卑)가 웬 말인가?
4. ‘훈맹정음’과 박두성
5. 변절과 변명 사이에서 교회개혁을 생각한다.

올해는 훈맹정음(訓盲正音)이 발표된 지 9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훈맹정음은 한글 점자(點字)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6년 11월 4일에 당시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박두성(朴斗星: 1888-1963)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발표하면서 훈맹정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두성이 제작한 훈맹정음이 최초의 한글 점자는 아닙니다. 그가 훈맹정음을 만들기 전에 이미 1898년에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평양맹아학교를 설립하고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은 어린 시절 미국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이 한글 점자를 만들면서 참고한 것은 뉴욕 포인트(New York Point) 4점 점자였습니다. 당시 점자는 단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는데, 뉴욕 포인트 점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뉴욕 포인트 점자는 프랑스 사람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가 만든 브라유식 6점 점자보다 점수가 작아서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1878년 이후 브라유식 점자가 보편화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오히려 로제타 홀은 뉴욕 포인트 점자와 브라유식 점자를 비교해 본 후 뉴욕 포인트 점자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4점식 한글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4점식 한글 점자는 평양을 중심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쓰였지만, 한글 자음의 초성과 종성이 구별되지 않아 많은 자모가 두 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점자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점식 한글 점자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유식 6점 점자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총독부는 1913년 4월에 제생원 맹아부(濟生院 盲啞部)를 설립하고 브라유식 6점 점자를 도입하여 6점식 일본어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6점 점자와 4점 점자를 비교하게 되었고, 제생원 학생들 사이에서 6점식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제생원 맹아부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한국인 교사를 구할 때 경성보통학교 교장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이 바로 박두성이었습니다. 이때 추천 조건 중 하나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적임자로 박두성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박두성은 1888년에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들과 함께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배우다가 이동휘가 강화에 세운 보창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이동휘가 세운 보창학교는 당시 기독교신앙에 근거한 민족교육을 한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였는데, 박두성은 이 학교에서 기독교신앙과 민족의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했고 1906년에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 양현동 보통학교 부교원을 거쳐 1907년부터 어의동 보통학교(於義洞 普通學校) 교사로 6년 넘게 일하다가 1913년부터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성이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로 일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생원 교사가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두성은 스스로 “나는 맹인을 위해 살 생각이 아니었는데, 월급에 방 두 칸 준다는 말에 얼씨구 갔다가 맹인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변했다.”고 항상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박두성은 자신의 말대로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생원 맹아부에는 일본인 교사 4명이 있었고 한국인 교사로는 박두성이 유일했는데, 총독부가 제생원 맹아부를 만든 목적이 시각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아서 몰래 죽이려는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의외로 입학하려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박두성은 직접 전국을 돌면서 학생을 모집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점자는 필수고, 일본어 점자가 아닌 한글 점자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두성은 로제타 홀이 만든 뉴욕 포인트 4점 점자인 평양 점자를 1918년에 접했지만 불편함이 많은 평양 점자 대신 브라유식 6점 한글 점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박두성은 홀에게 평양 점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6점 한글 점자 제작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홀은 평양 점자의 사용을 계속 주장해서 결국 박두성은 독자적으로 6점 점자를 제작했습니다.
박두성은 노학우, 전태환 등 제자들과 함께 1920년 10월부터 한글 점자를 제작했습니다. 이때 목표한 제작 기준은 1) 점자는 배우기 쉬워야 하고 2) 점자의 수는 적어야 하며, 3) 서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1921년에 초안을 만들었고, 1923년 봄에는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만든 한글 점자는 자음을 모두 세 점으로 하고 모음은 두 점으로 했기 때문에 3.2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3.2점자는 초성과 종성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단오’를 ‘다노’로, ‘학예’를 ‘하계’로 읽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두성은 1923년 4월부터 노학우, 전태환, 김영규, 김황봉, 유도윤, 이종덕, 이종화, 황삼채 등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고 3.2점자의 문제점을 해결한 한글 점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초안을 만들었고, 그중에 박두성이 만든 초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맹정음’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훈민정음이었고, 로제타 홀이 만든 평양점자의 공식적인 이름이 조선훈맹점자였으며, 일본점자의 이름도 훈맹점자였기에 박두성과 제자들은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이 되는 1926년 11월 4일에 훈맹정음 반포식 행사를 했습니다. 박두성은 훈맹정음 완성 이후 점자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을 출판하였으며, 점자통신교육을 통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박두성이 점자 보급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중에는 성경을 점역(點譯)하여 보급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사명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이 일을 했는데, 대영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1931년 4월부터 마태복음을 점역하기 시작하여 1948년까지 신약성경 전체를 완역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신약 점자 아연판이 소실되자 다시 제작에 착수하여 1957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점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산 박두성을 향해 많은 사람이 “맹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칭송했지만, 그 자신은 “내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글을 점자로 만들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앞 못 보는 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성경을 찍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과도한 칭찬을 물리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자이고, 자신들 스스로도 주체적인 사람이 아닌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체념하고 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 점자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의 노력을 기울인 박두성의 삶은 일제 강점기에 직접적으로 독립과 민족운동 등의 가치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과 민족을 위한 실천적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일생토록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산 까닭에 교회가 시각장애인들을 동등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길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그를 ‘교회의 실천적 개혁자’라고 평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 ‘한국교회사를 통해 본 교회개혁운동’ 1~3화는 홈페이지-칼럼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쓴이 소개: 김일환 목사는 장로교(예장통합) 목사로 동국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공부했고, 서울장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장신대학교 박사 과정(한국교회사 전공)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