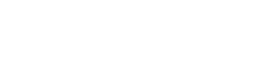우리의 기부문화를 돌아보자 [뉴조06/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7-04 14:19 / 조회 2,130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우리의 기부문화를 돌아보자
미국와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2006년 06월 30일 (금) 13:36:53 나관호 ( khna63 )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상류 계층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곧잘 인용되곤 한다. 이 말은 본래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는 프랑스 어 속담 “Noblesse oblige”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정신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 주식 투자의 신화를 만들어 온 세계 2위 부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 어치 주식을 자선단체에 내놓기로 했다. 기부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버핏의 총재산은 발표 당일(미국시각 25일)의 주가로 계산하면 440억 달러다. 버핏은 기부금의 80%가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만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www.gatesfoundation.org)'에 주기로 했다. 빌 게이츠도 놀랐다.
뉴욕 타임스는 “버핏의 기부금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년 예산의 61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버핏은 이번 기부로 록펠러·카네기·포드 같은 저명한 자선사업가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세계가 놀란 것은 기부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의 정신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와 손을 잡았다는데서 더 관심을 끌었다. 세계 1, 2위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뜻을 합쳐 초대형 '자선 합작회사'를 가동한 것이다.
빌 게이츠 또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중 자녀들을 위해선 1000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사업에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얼마 전 2008년부터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재단업무에만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를 사회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고 또 최선의 방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철학이다. 세계 제1의 갑부와 세계 제2의 갑부가 자선사업에서 사상최대의 합병을 이뤄낸 셈이다.
게이츠와 버핏의 선한경쟁이 너무 아름답다. 서양 전통에서 사유 재산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렬(同列) 또는 그 연장선상의 핵심적 인간 권리로 취급돼 왔다. 사유재산권을 신성시(神聖視)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을 벌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았던 기업가들이 성공한 다음에는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의 삶’이 몸에 각인되어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앤드루 카네기·존 록펠러·헨리 포드·폴 게티 등 그 사례를 꼽자면 끝이 없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활력과 건강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돈을 벌 때의 기록만 있고 그 이후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기업문화와 여론의 압력을 통해 사유재산의 사회헌납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국가권력이 병존(竝存)하는 것이 한국의 가진자의 자본주의다. 그런 한국의 풍토이기에 버핏과 게이츠가 이뤄낸 자선합작(慈善合作)이 기적처럼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 세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었다. 선비 갑부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경작할 땅에 대한 지세를 조금만 받았고 마음대로 쌀을 퍼가도록 만든 뒤지를 대문 앞에 두기도 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선비 갑부들은 전쟁이나 기근 등 백성과 나라에 위기 있을 때마다 곡간을 열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마음껏 실천했다. 조상들의 정신이 현재의 부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맨들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일반 백성은 ‘향약’(鄕約)이라는 향촌의 자치규약에 따라 서로 도왔다. 이율곡 선생이 만들었다는 해주향약의 ‘환난상휼’(患難相恤)을 보자. 이것은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 마을 주민 집이 불로 소실되면 집당 장정 한 명씩 보내 하루 먹을 양식과 짚 세 다발 ·통나무 한 그루·새끼 열 발씩을 들고 봉사한다.
- 도둑을 맞으면 양식이나 숟가락 밥그릇을 배분해 채워준다.
- 환자가 생기면 의원을 모셔 오고 경비는 나눠 낸다.
- 모든 식구가 앓아 농사를 짓지 못 할 때는 사람을 모아 대신 지어준다.
- 가난으로 노처녀가 생기면 힘을 모아 시집을 보내준다.
- 가난으로 끼니를 못 이으면 집집마다 밥을 넉넉히 지어 나눠 먹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전통은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약은 자치규약이기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적지만 자율성을 믿는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백성들의 정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재민들의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면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국민의 온정이 몰린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금에 참여했다. 유독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은 슬픈 사연을 알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ARS 모금이 성공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미국의 차이점은 거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듀폰·보잉과 같은 대기업들의 기부금만 매년 2000만~1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빌 게이츠·테드 터너·조지 소로스 등의 거부들도 수시로 교육기관과 공익재단에 천문학적 금액을 내놓는다.
미국에서 기부문화가 꽃을 피운 근본 이유는 카네기·록펠러·포드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활동에 앞장선 훌륭한 모델이 있었다는 점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빌 게이츠·워런 버핏 등에게 이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또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20, 30대 벤처기업가들에게 연결된다. 부시 대통령이 유산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다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부딪힌 것을 잘 알고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와 기부활동의 위축 등이 주된 이유였다.
몇 년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9000원에 불과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50%에 달한다. 1 인당 기부금 120만 원, 기부 참여비율 89%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미덕처럼 나눔의 기쁨이 커질수록 나라·사회·기업·가정도 모두 건강해질 것이다. ‘~다워야 한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한다. 그리고 기독인은 더더욱 기독교인다워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말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보다 갚진 것이 있으랴.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복음전파의 한 방법이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기쁨이다. 보람이다. 가진 자들이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니까.
나관호 / 목사,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미국와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2006년 06월 30일 (금) 13:36:53 나관호 ( khna63 )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지배층 인사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때 우리는 상류 계층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는 철학과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상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곧잘 인용되곤 한다. 이 말은 본래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는 프랑스 어 속담 “Noblesse oblige”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거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도덕적·정신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 주식 투자의 신화를 만들어 온 세계 2위 부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 어치 주식을 자선단체에 내놓기로 했다. 기부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버핏의 총재산은 발표 당일(미국시각 25일)의 주가로 계산하면 440억 달러다. 버핏은 기부금의 80%가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만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www.gatesfoundation.org)'에 주기로 했다. 빌 게이츠도 놀랐다.
뉴욕 타임스는 “버핏의 기부금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1년 예산의 61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며, 버핏은 이번 기부로 록펠러·카네기·포드 같은 저명한 자선사업가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세계가 놀란 것은 기부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의 정신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와 손을 잡았다는데서 더 관심을 끌었다. 세계 1, 2위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뜻을 합쳐 초대형 '자선 합작회사'를 가동한 것이다.
빌 게이츠 또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중 자녀들을 위해선 1000만 달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사업에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얼마 전 2008년부터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재단업무에만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를 사회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고 또 최선의 방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철학이다. 세계 제1의 갑부와 세계 제2의 갑부가 자선사업에서 사상최대의 합병을 이뤄낸 셈이다.
게이츠와 버핏의 선한경쟁이 너무 아름답다. 서양 전통에서 사유 재산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동렬(同列) 또는 그 연장선상의 핵심적 인간 권리로 취급돼 왔다. 사유재산권을 신성시(神聖視)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회에서 돈을 벌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착같았던 기업가들이 성공한 다음에는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미국의 기업가 정신이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의 삶’이 몸에 각인되어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앤드루 카네기·존 록펠러·헨리 포드·폴 게티 등 그 사례를 꼽자면 끝이 없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활력과 건강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돈을 벌 때의 기록만 있고 그 이후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기업문화와 여론의 압력을 통해 사유재산의 사회헌납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국가권력이 병존(竝存)하는 것이 한국의 가진자의 자본주의다. 그런 한국의 풍토이기에 버핏과 게이츠가 이뤄낸 자선합작(慈善合作)이 기적처럼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 세계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가치관이 높았었다. 선비 갑부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경작할 땅에 대한 지세를 조금만 받았고 마음대로 쌀을 퍼가도록 만든 뒤지를 대문 앞에 두기도 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선비 갑부들은 전쟁이나 기근 등 백성과 나라에 위기 있을 때마다 곡간을 열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마음껏 실천했다. 조상들의 정신이 현재의 부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맨들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일반 백성은 ‘향약’(鄕約)이라는 향촌의 자치규약에 따라 서로 도왔다. 이율곡 선생이 만들었다는 해주향약의 ‘환난상휼’(患難相恤)을 보자. 이것은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 마을 주민 집이 불로 소실되면 집당 장정 한 명씩 보내 하루 먹을 양식과 짚 세 다발 ·통나무 한 그루·새끼 열 발씩을 들고 봉사한다.
- 도둑을 맞으면 양식이나 숟가락 밥그릇을 배분해 채워준다.
- 환자가 생기면 의원을 모셔 오고 경비는 나눠 낸다.
- 모든 식구가 앓아 농사를 짓지 못 할 때는 사람을 모아 대신 지어준다.
- 가난으로 노처녀가 생기면 힘을 모아 시집을 보내준다.
- 가난으로 끼니를 못 이으면 집집마다 밥을 넉넉히 지어 나눠 먹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전통은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약은 자치규약이기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적지만 자율성을 믿는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백성들의 정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재민들의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면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국민의 온정이 몰린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금에 참여했다. 유독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은 슬픈 사연을 알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사랑의 리퀘스트’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ARS 모금이 성공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미국의 차이점은 거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다. 미국의 경우 월마트·듀폰·보잉과 같은 대기업들의 기부금만 매년 2000만~1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빌 게이츠·테드 터너·조지 소로스 등의 거부들도 수시로 교육기관과 공익재단에 천문학적 금액을 내놓는다.
미국에서 기부문화가 꽃을 피운 근본 이유는 카네기·록펠러·포드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활동에 앞장선 훌륭한 모델이 있었다는 점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빌 게이츠·워런 버핏 등에게 이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또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20, 30대 벤처기업가들에게 연결된다. 부시 대통령이 유산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추진하다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부딪힌 것을 잘 알고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와 기부활동의 위축 등이 주된 이유였다.
몇 년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 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9000원에 불과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50%에 달한다. 1 인당 기부금 120만 원, 기부 참여비율 89%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의 미덕처럼 나눔의 기쁨이 커질수록 나라·사회·기업·가정도 모두 건강해질 것이다. ‘~다워야 한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다워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한다. 그리고 기독인은 더더욱 기독교인다워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말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칭호보다 갚진 것이 있으랴.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복음전파의 한 방법이다.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기쁨이다. 보람이다. 가진 자들이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니까.
나관호 / 목사,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이전글8월 24~25일 교회법연구원 제2기 아카데미[크리스챤투데이07/03] 2006-07-04
- 다음글기윤실, 상담자 자질 위한 교육 실시[크리스챤투데이06/28] 2006-06-29